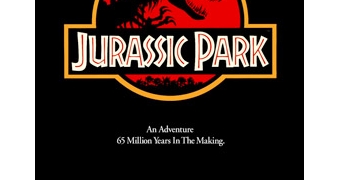절망을 견뎌낸 희망의 등불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첫 직장은 결국 부도가 났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즈음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마저 절교를 선언했고, 그해 겨울 내내 대포항에 머물렀죠.
머물렀던 민박집은 가파른 언덕을 한참이나 올라간 곳에 있었습니다. 어촌마을에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도시생활에 익숙한 터라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넓은 통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는 게 큰 위안이었죠. 언덕배기를 오르내리는 수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으니.
‘산다는 것이 마치 겨울바다 같아’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인 할머니의 태도였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휘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는데 내게 항상 퉁명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무슨 적개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할머니를 마주치는 것이 여간 불편했어요. 집에는 할머니만큼이나 늙어버린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면 묘한 울음소리를 내었죠. 이런 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새벽에 잠깐 선잠이 들라치면 예의 소름끼치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나를 노려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는 포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긴 방파제를 따라 걷다보면 어시장이 있었습니다. 좁다란 길 양편으로 포장이 드리워진 어시장은 항상 인적이 뜸했습니다. 간혹 횟감을 사러 몇 명이 왔다가 잠시 차를 멈추고, 흥정을 마치면 빠르게 사라져 버렸지요. 길바닥에는 시커먼 해초들이 뒤엉켜져 있었는데 해초들이 마치 꼬여버린 내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지고 나면, 거리는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선창가 포장마차 한 귀퉁이에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바람이 저 먼 바다로부터 불어올 때면 포장은 펄럭펄럭 기침을 해댔지요. 포장이 펄럭거리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쿨럭 쿨럭 슬픔 한 뭉치가 쏟아져 나올 것처럼.
‘산다는 것이 마치 겨울바다 같아, 차갑고 어둡고 깊고 아프다.’ 포장마차 틈 사이, 겨울바람이 들어와 목뒤가 서늘할 때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절거리지 않고는 바람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단단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들어 올려 바다 저 한가운데 내 팽개칠 것 같았어요. 삶을 부여잡은 희망이 사라져 언제든지 바다의 경계너머에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 새벽녘, 방문 밖 발소리
어느 날 잔뜩 취해 민박집을 들어와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흐느끼듯 우는 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 앞으로 서성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으로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왔다간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죠. 소름끼치도록 무서웠지만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내 어깨를 눌러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일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의 선창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나는 우연히 두 사내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할머니 요즘은 등대에 안보이네.” “아들 보낸 지 한 4~5년 됐지? 아마” “그렇지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지성을 드리던데....별일이네.”
직감적으로 민박집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태풍으로 아들을 잃고 매일 새벽 등대에서 아들을 위해 지성을 드렸는데 요즘은 안 보여 걱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도 겨우 몸을 가눌 정도로 취해서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짙은 어둠 저 너머 바다엔 구름이 잔뜩 끼어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방문 근처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분명했죠. 순간 확 몰려드는 무서움에 잠이 깼습니다. 가만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속에서 희끄무레한 작은 형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서있었습니다. “별일 없어?”
“별일이라뇨?” “큰일이라도 치를까 걱정이 돼서.”
순간 매일 새벽 방문을 서성거렸던 건 할머니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살이라도 할까봐 그렇게 할머니는 잠도 자지 않고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명치끝을 묵직해지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꼭 죽은 아들놈 같아서.” 할머니는 가만히 손을 들어 등대를 가리켰습니다. “그 녀석 등대 불 따라 언제 한번은 올 거야. 지애미 보러 꼭 올 거야.”
할머니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등대 불이 지나갈 때마다 바다 위로 하얗게 눈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겨울바다에는 등대가 있었고, 할머니의 소망을 대신해 어둡고 깊은 겨울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해 겨울바다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킨 보석
가넷(garnett)이란 보석을 아시나요? 가넷은 루비하고 비슷한 빨간색이어서 루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아실 테죠. 세상이 온갖 악행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들에게 물의 심판을 하기로 합니다. 노아 한 가족과 한 쌍의 동물 및 식물을 제외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홍수로 휩쓸어 버립니다. 세상에는 줄기차게 비가 내렸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온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때 방주의 생명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세 개의 가넷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절망을 견뎌내게 했던 희망의 등불이었지요. 그래서 가넷의 보석 말은 희망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바다에서 봤던 할머니의 바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바다를 밝혀줄 한줌의 불빛, 작은 희망이 있다면.
이승우 님은 보석과 삶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며 보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문예지에 시를 발표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석회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보석감정사(Graduated Gemologist)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