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줘야지, 서늘한 바람에 슬픔이 묻어있으니”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_ 에릭 홈스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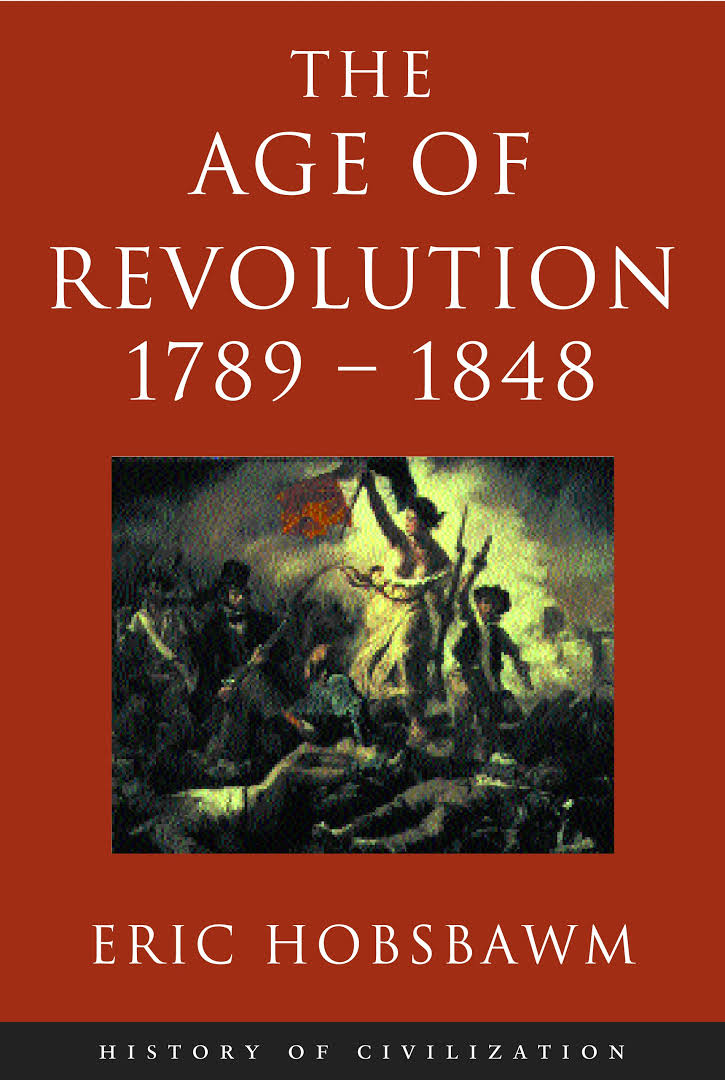
영화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지켜보는 내내, 울화통이 터지고 심박수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죠. 심박수 챌린지까지 열리고 있는 걸 보니…. 알고 있던 역사였지만, 스크린을 투사된 영화적 연출은 극적이고 눈물까지 자아냈습니다. 공분을 부르는 여러 지점이 있었지만, 전두광(황정민 분)의 대사가 달팽이관의 평형감각을 휘청이게 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춘추전국시대 묵자(墨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열 명을 죽이면 인간 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미 많이 오염돼 있지만, 전두광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 고막이 짓이겨지는 느낌이랄까요. 공분을 가라앉히고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
단골인 조영이 찾아왔습니다. 간간이 함께 지금과 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야길 나누는 단골입니다. 이심전심이었을까요. 《혁명의 시대》를 들고 왔습니다. <밤9시의커피> 책장에도 꽂혀 있는 책입니다. 이심전심 단골을 위해 감히 ‘혁명 커피’를 볶아서 내렸습니다. 단골에게 특별히 1,900원에 제공합니다. 타살된 혁명을 위해, ‘다른 세상’을 꿈꾸고 상상하는 사람들과 나누고팠습니다. 조영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길 나눕니다.

“거부했건만, 사라지지 않았다.”
2012년 10월 1일 향년 95세로 떠난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입니다. 탁월한 역사학자로 《혁명의 시대》를 지은, 명민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혁명주의자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두광’의 더럽고 광폭한 입이 내뱉은 말을 씻으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 가닿은 운명이지만, 홉스봄은 1917년 태어났어요. 러시아 10월혁명(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리곤 그 10월혁명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산 홉스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죠. “10월 혁명의 꿈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에 남아 있다. 내버리고 거부했건만, 사라지지 않았다.”
조영에게 말합니다. “이런 미친 고해성사는 정말 가슴 찡하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 박힌 ‘혁명의 시대’를 죽을 때까지 내치지 않다니. 물론 내버리고 거부하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니, 이건 곧 사랑 아니에요?”
“맞아요. 성찰을 바탕으로 한 신념으로 평생을 지탱한 홉스봄에게 혁명은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이었겠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와, 드라마 <연인> 카피를 이럴 때 써먹다니! 어쩌면 <연인>의 장현이 임금보다 백성을 더 생각해서 칼을 든 이유나 아버지와 가문을 떠난 기저에 혁명이 자리 잡고 있던 건 아닌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공허하게 남발된 ‘공동체’라는 말
조영은 고개를 주억거립니다. “혁명? 대한민국에 여즉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당가요? 하하. 아니다. 혁명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단어는 오염됐으니, 그 달달한 것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젠 각자도생만 자욱하니, 연대나 공동체도 가물가물하고.”
“에이, 그래도 <밤9시의커피>에는 소박하지만, 그런 게 쪼금 있지 않아요?”
“아 그러긴 하네요. 공동체, 지금은 소멸된 단어 같지만, 홉스봄이 이런 신랄한 말도 했어요. “사회학적 의미에서 공동체들이 실재의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최근 수십 년 동안처럼 ‘공동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고도 공허하게 남발된 것도 없을 것이다.” <밤9시의커피>에 오는 이유 중 하나도 작지만 ‘느낌의 공동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대단한 칭찬인데요. 그런데 그건 조영을 비롯해 단골들이 함께, 즉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작아도 이것저것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무척 고마워하고 있는 것 알죠?” 주거니 받거니, 깊어 가는 겨울밤에 맞춰 대화도 무르익습니다.
조영은 《혁명의 시대》를 읽고,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그리고 자서전인 《미완의 시대》까지 읽어보겠다는 야망(?)을 말합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앨범을 하나 꺼냅니다.
“오늘, BGM으로 재즈 어때요? 짜잔, 빌리 홀리데이 앨범 갖고 왔어요.”
“와우~~ 역시 조영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니까. 오늘 안 왔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진짜.”
“홉스봄이 마르크스와 혁명만큼 좋아했던 재즈도 준비했죠. 이만하면 혁명적 센스 아니에요? 하하. 낭만은 혹시 읽어봤어요? 《저항과 반역 그리고 재즈(Jazz Scene)》?”
“아뇨. 근데 제목이 정말 근사해요. 그것도 혹시 홈스봄이 쓴?”
“홈스봄이 재즈광이라서 ‘프랜시스 뉴턴’이라는 필명으로 냈어요. 역사에 대해선 불편부당한 자세를 꼿꼿이 유지했는데, 홈스봄도 재즈 앞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흐물흐물해진다니까요. 되게 주관적이고 격정적으로 재즈에 아낌없는 헌사를 바치거든요. 물론 이유도 있어요. 재즈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근간을 두면서도 주류 예술로 성장한 아주 드문 사례라는 이유였죠.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재즈의 시대’라는 책도 냈을지 몰라요.”
그리하여 홈스봄이 격하게 아꼈던 빌리 홀리데이의 선율이 <밤9시의커피>에 흐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겨울밤을 촉촉이 매만집니다. 홉스봄에게 추도사를 받았던 빌리 홀리데이지만, 지금은 홀리데이가 홉스봄을 위해 이런 노래를 불러줄 것 같습니다. “The Man I Love. I Cried for You.”

시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아라파호 족) 11월을 건너, ‘다른 세상의 달’(체로키 족) 12월에 도달합니다. 진짜 혁명 혹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레시피로 한 커피를 당분간 내리려고요. 홉스봄이 자서전 마지막에 쓴 이 말을 쪽지에 써서 건네고요.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 불의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미완의 시대》) 85세 때, 여전히 세상의 불의에 맞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외침을 외면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외면해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까요. 혁명 없는 시대에 이 서늘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홈스봄 덕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 바람결에 묻은 슬픔은, 혹시 혁명이 슬쩍 흘린 것일까요? <연인>의 명대사인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를 바꿔서 문에 붙입니다. “커피 줘야지, 서늘한 바람에 슬픔이 묻어있으니.”

‘밤9시의 커피’는 다정하고 환대가 넘치는 가상의 카페입니다. 불면을 부르는 커피가 아닌, 분주한 일상이지만 늘 깨어있는 존재로 남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음료, 그 이상’인 커피를 매개로 가상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상상하고 공감합니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