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안전망
가위, 바위, 보 게임의 매력은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데에 있다. 이 게임의 룰을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원리로 차용한 최근 연구가 흥미를 끈다.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서로 다른 세 집단의 대장균들이 증식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도 이 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 집단이 있다고 치자. 콜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는 집단 A는 증식 속도가 가장 빠른 집단 B의 증식 속도를 억제한다. 반면 가장 열등한 기능을 지닌 집단 C는 콜리신에 저항성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세 집단은 가위바위보의 게임 룰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경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자연 상태에 있는 생명체들의 균형 잡힌 공존 관계는 생명체의 영속성이 어떻게 구현돼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된다.

‘자본’의 생산 방식과 흐름
생물체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생명체인 사람의 문제로 좁혀보면 어떻게 될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연계의 생명체 메커니즘은 약육강식 속에서도 균형과 공존의 원리를 선택했다. 반면에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삶의 양태에서 가장 우월한 패권을 쥐고 있는 ‘자본’의 생산 방식과 흐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벌써 몇 해 전 이야기이다. 지구촌 60억 인구의 소득을 조사했더니 고소득층 상위 20%가 전체 재산의 75%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최하위 20%는 전체 소득의 겨우 2%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과거 1960년대는 재산 보유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대략 30배 정도 많은 재산을 보유했었다는 조사와 비교해보면 인간의 삶의 양식이 균형과 공존과는 확연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꾸준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는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파레토 법칙’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간 생존의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용어는 상위 20%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독점한다는 특성을 분석해 낸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1848-1923)의 이름에서 따왔다.
1980년대 영국은 공기업의 부실한 경영 성과를 문제 삼으며 구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대처 수상의 집권으로 시작한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행정부가 막을 올리면서 세계는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라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린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돼 버린 세계화가 시작된 것이다. 로버트 노직(1938-2002)과 밀턴 프리드만 (1912-2006) 등의 자유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를 이념과 정책에서 추구한다. 다시 말해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정부 지출의 복지비용 감축,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산업 구조 조정,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등 시장원리에 절대적인 확신을 둔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 결과 시장 경쟁에 의해 중앙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이윤의 영역을 개인들이 스스로 찾아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원리가 확산됐다. 아담 스미스의 말마따나 푸줏간에 걸려 있는 고깃덩이가 저녁 식탁에 오르는 것은 푸줏간 주인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먹겠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신자유주주의 경제 이념은 ‘경쟁’과 ‘시장’의 원리만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리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만들어내는 역기능이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결과, 기업의 전체 수익성은 증가했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경제적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독점되기에 이른다. 이른바 ‘승자 독식 사회(Winner takes it all)’가 발생해 균형 잡힌 성장과 공존의 인간 관계의 형성을 저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웨덴 출신 그룹인 아바(Abba)가 부른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감미로운 곡은 이제 사랑과 실연의 인간적인 노래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바위’와 ‘가위’가 펼치는 서바이벌 게임의 주제곡으로 변주돼 들린다. 특히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소수가 가지는 박탈감과 인간적 가치의 상실감은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그물을 찢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소외된 사람들의 패배감만을 따지거나 탓하기보다는 관용과 나눔의 사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견고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만이 사회, 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해 대중을 향해 무작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흔히 선진국형 범죄로 불리는 ‘묻지마 범죄(Random Crime)’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의 《자유론》과 존 롤스의 《정의론》
결국 세계화 시대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균형과 공존은 모색돼야 할 것이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적 의미에서 사회 복지 체제의 좀 더 인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말한 자유의 의미가 어쩌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가 우리 시대에서 최소한 가질 수 있는 ‘공존’과 ‘균형’의 자유일지도 모른다.
밀이 말한 ‘여론’이라는 용어를 ‘신자유주의’란 말로 살짝 바꿔 그의 견해를 빌리면 다음과 같다.
“여론(신자유주의)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신자유주의)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온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중략) …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런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서로를 수용하며 발전하는 양상으로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적 가치는 대립한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에 보수의 한 축이 있다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적 화두로 삼는 진보의 또 다른 축이 마치 옷감의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다. 두 가지 가치 모두 함부로 폄훼할 수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사회정의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롤스의 말이 변증법적이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요구인 평등의 이념을 수용해 사회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운다. 그가 내세운 제 1원칙, 즉 평등한 자유주의 원칙은 사상, 양심, 언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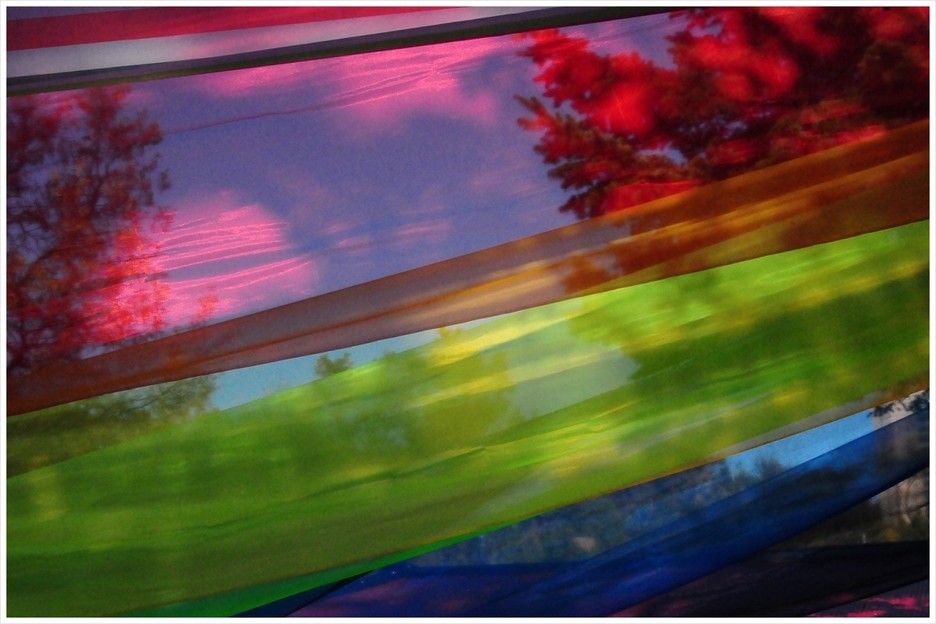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대목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제 2원칙이다.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과 더불어 그가 강조한 것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인 빈곤 계층을 사회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를 인정한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빌 언덕’을 마련한 우리의 복지 체계는 합리적인 여건 아래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복지 체계는 우선 제도의 개혁이라는 물리적 변화가 중요하다. 또한 생태계에 생물체의 다원성이 존재하듯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에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경제적 지수의 ‘다름’을 차별화하지 않는 관용의 화학적 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균형감 있는 사회 발전을 추구할 때 인간 존재의 영속성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