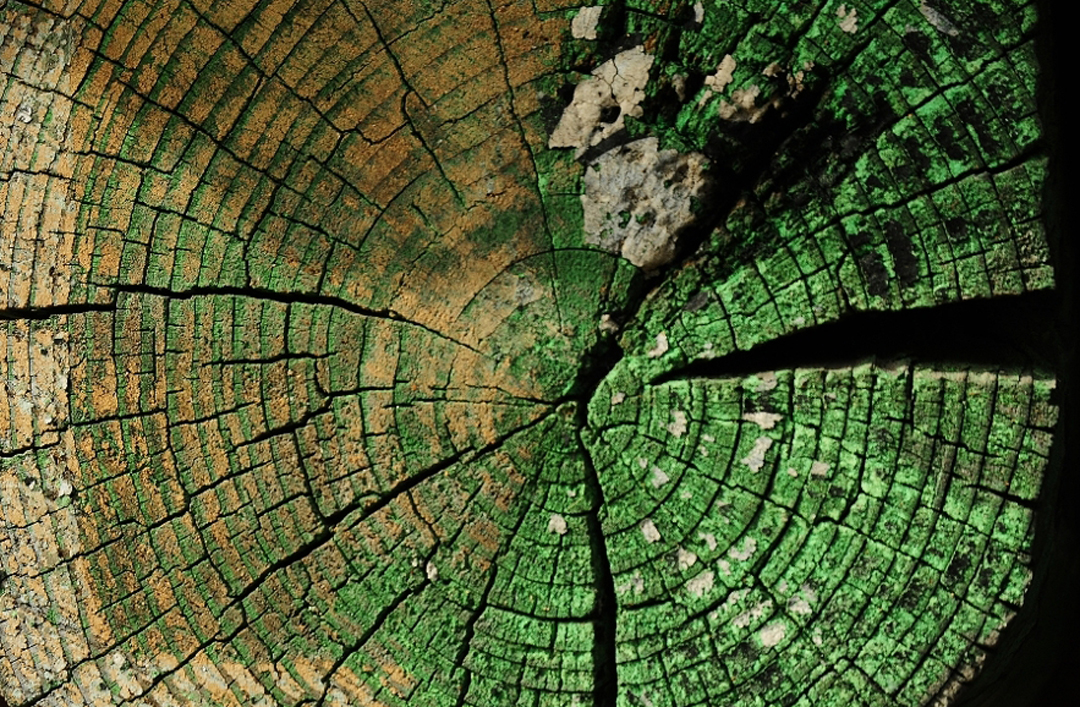가을, 세 개의 풍경

이제는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요. 한 번쯤은 괜찮지만 두 번은 시시해지는, 당신이 몰라도 될 사소한 이야기, 해도 되겠지요. 너무 오래되어 빛바랜 은행잎 같은 이야기. 은행잎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므로, 하여 가을은 노랗게 저물고 언젠간 노란 물관이 마르면서 수분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야길 말이죠.
Ⅰ. 강(江)
벌써 아이가 둘이라고 했던가요. 조약돌 같은 잇몸을 반짝이며, 나뭇잎 같은 손으로 아이는 얼마나 많은 꿈을 매만지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까요. 말랑말랑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아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게 기지개를 켜며 아침마다 자라고 있을까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는 오늘 하루 어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는지. 그 바람이 되지 못해, 행복한 바람이 되지 못해, 서러운 제 가을은 외투 깃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당신’이라는 말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지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당신이라는 말 한 마디에는 평생 다하지 못할 책임감과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믿음이 흘러야 하지요. 그 넓고 깊은 당신이라는 강물에, 건너와주길 기다리며 밤낮으로 흐르던 그 강심에 미처 다다르지 못하여, 제 삶은 정처 없이 떠돌듯 흘러 일기장에는 태우지도 못하는 슬픔이 안개처럼 머물고 있었지요.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누군가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속눈썹 긴 당신의 눈동자에 따스한 가을볕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다가 그 가을볕에 제가 함께 있었어야 했었는데, 라고 쓰다가 이 가을 세상의 모든 향기와 아름다운 그림자와 따듯해서 달콤한 우리의 입맞춤이 까만 어둠을 녹여 새벽별 뜰 때까지 함께 이어지기를 바라며, 라고 쓰다가 이 미련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인하여, 생각으로부터 천천히 그물을 걷어 들이듯 발걸음을 뒤로 뒤로 옮기며 망상들을 지우곤 합니다.

새들이 기억하는 허공의 발자국이 바람에 실려 가지 않듯 당신을 잊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 제겐 당신은 강의 모습으로 기억나는 건가요. 제가 가을 강보다 더 깊이깊이 흐를 수 있을 때면 당신은 제게 무엇으로 남을까요. 언젠가 훗날 제가 불현듯, 가을보다 더 깊이 흐르고 흘러 이 세상 어디 용서받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곁이 당신이라면, 그런 때가 오면 알 수 있을까요. 그해 가을의 갈대가 어째서 서러움이었는지를, 왜 갈대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에만 제 몸을 흔드는지를,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서러움의 참혹함을.
Ⅱ. 세검정
당신이 몰랐던, 이제 몰라도 상관없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혹여 이것만큼은 알고 있나요, 세검정은 제게 밥이었고 옷이었고 웃음이었고 평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세검정은 또 제게 상처였고 고름이었고 헐벗음이었고 구토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선 그 길을 가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쳐다보지도 못했고 ‘세. 검. 정.’ 세 마디 입에 담지 않기 위해 돌고 돌아 다녔지요.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들이 많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몇 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 있고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지요. 그 몇 마디의 말에 저는 휘청거렸고, 세상은 모든 것이 스러지는 빛으로만 보였고, 빛은 산란하면서 어지럽게 흩어졌지요.
그해 가을은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세검정은 제가 죽은 곳이고, 죽은 제가 유령처럼 걸어다니던 과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까요. 비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경솔했을까요. 그 가을의 끝 무렵에 낙엽은 통속적으로 쌓였고 당신의 집 뒤편 개암나무의 열매들은 끝없이 쏟아져, 제 눈에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줄로만 보였지요. 그렇게 하나의 세월이 가고 하나의 헤어짐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질 때, 세검정의 가을은 독한 몸살을 앓듯 깊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진부하고 속물적으로 살아야한다고, 은행잎이 돈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당신이 몰래 속삭여주듯이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한 잔의 식어버린 커피처럼 당신의 가슴은 조금씩 차가워지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세검정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아주 말갛게 가라앉은, 그해 가을날의 개암 같은 커피를 갈아 말갛게 슬픔을 가라앉힌 기억을 한 잔 들고 세검정을 걷고 있습니다. 홍지문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답군요. 돌이켜보면 홍지문은 제게 한 명의 사람이었고 곧 당신이었고, 한 잔의 커피였으며 한 두름의 추억입니다. 세검정부터 홍지문까지의 짧은 거리에 우리가 뿌렸던 많은 시간이 어디에선가는 켜켜이 쌓여있으리라 믿습니다.
홍지문 돌문 틈으로 가을이 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바싹 말라 마지막 순번을 기다리던 낙엽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세상, 미련 없다는 듯 떨어져 내립니다. 가까이 다가서보니 성곽의 돌 틈에서 소풍 나온 먼지들이 햇살과 간혹 부는 바람과 어울려 한참을 떠돌다 겨우 낙엽에 자리를 잡고 눕네요. 성곽의 먼지들은 얼마나 오래된 세월을 견뎌왔을까요. 먼지들에게 귀가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테지요.
당신과 나의 한때의 꿈과 약속이 영글던 자리에 당신은 옆에 없고 온 몸이 기억하는 대로 저는 기억을 곱씹어봅니다. 사람의 감각은 깊이 묻혀있는 우물과 같습니다. 먼지 더께를 걷어내고 두레박 한 바가지 기억 속으로 내리면 사라졌을 것 같던 시간을 어느새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 이제 세검정에는 오지 마십시오. 이곳의 기억과 시간은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혹여 남아 있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버리고도 남는 것이 혹시 있다면 어느 밤 별자리 하나를 골라 아무렇게나 걸어두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멀리서만 반짝이는 별이 되기로 하지요.

Ⅲ. 마음의 풍경
그리고 꿈을 꾸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절을 거슬러 가는 길 속에서 번번이 넘어졌다. 어떤 날은 귀가하다 길 모퉁이를 돌아 들어간 그 골목이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붉은 철계단을 올라야 했던 옥탑방은 유폐의 공간이었다. 잔설이 아직 쌓여 있는 전봇대 아래에는 중심에서 떠밀려 온 햇살이 사람들의 발걸음에 차이고 있었다. 골목에서 몇 발자국만 뒤로 걷다보면 왜 생각들이 앞으로만 쏠렸는지 퓨즈가 나가버린 듯한 신경에 금세 피가 돌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새 가을이 좁은 보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 떠나가는 게 보였다. 그렇게 나도 건너가고 싶은 길이 있었다. 아니다, 아니다, 온 몸으로 속이고 싶던 시절, 돌아보면 끝내 건너지 못해 내 안에 매듭으로 남은 말 한 마디, 감각 하나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리 달아나는, 삶에는 그런 시절이 있고, 그 시절에 사람이 있다.